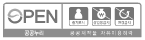2025년 08월호 뉴스레터
- 박선미 한중연구소 연구위원
13년 만에 재개관한 PEM 한국관
지난 5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 위치한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Peabody Essex Museum, 이하 PEM) 한국관이 ‘유길준갤러리(Yu Kil-chun Gallery)’라는 이름으로 개관식을 가졌다. 2003년 2층 전시실 한쪽에 작은 규모로 처음 문을 열었는데, 2012년 확장공사로 폐관되었다가 자금난 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13년 만에 재개관했다. 2010년에 방문했던 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한 마음으로 다시 그곳을 찾았다.

피바디에섹스박물관 2층 전체에 마련된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들
개관식은 오후 5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유길준갤러리의 역사, 개관 의미, 전시 기획 방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통음악 연주와 문화공연이 있었으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있었다. 대한민국 외교부 관계자, 보스턴 총영사관 인사들, PEM 관장 린다 하티건(Lynda Roscoe Hartigan), 세일럼 시장,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하버드대학교‧MIT 등 인근 대학 관계자들과 한국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시를 준비한 큐레이터의 말을 들어보니 이외에도 미주한인회에 속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이 개관을 위해 후원하였다. 10년 넘게 닫혀 있던 한국관이 이번에 재개관하게 된 데에는 한인사회의 자발적 모금과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유길준갤러리 개관식의 관람객들
최초의 미국 유학생 유길준과 PEM의 인연
PEM 유길준갤러리는 미국 내 다른 박물관의 한국전시실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시실이 처음 개관한 것은 2003년이었지만, 그 시작은 1880년대부터였다. 개화파인 유길준은 1883년 보빙사 수행원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뉴욕을 거쳐 워싱턴D.C를 방문한 보빙사 일행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 체스터 아서(Chester A. Arthur)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유길준은 미국에 계속 남아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일럼에 살았다. 최초의 조선인 미국 유학생이 된 그는 체류 중이었던 1884년 PEM에 다양한 개인 소지품을 기증했고, 각각의 물품에 용도와 의미에 대한 해설까지 직접 덧붙였다. 오늘날 박물관 큐레이터를 한 셈이다.
이런 사연으로, 일반적으로 유물을 구입하여 전시하는 다른 한국관과는 달리, PEM은 박물관 전시 사상 보기 드물게 ‘기증자의 언어로 구성된 전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사의 또 다른 소중한 기억이 PEM 한국관에 있는 것이다.
개항기 서양식 복장에서 21세기 비디오아트까지
새롭게 문을 연 전시실은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간도 제법 넓었다. 전시 유물도 다양하여 전통 유물과 현대미술을 아우르고 있었다. 15년 전 방문 당시 중국의 자개 전시 코너 한구석에 유길준 사진과 그가 유학 시절 스승이었던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에게 쓴 편지가 놓여 있었던 것이 기억났다.
스크린에 디지털로 복원된 유길준 생가와 유학 시절 생활 모습이 보이고, 당시 유행했던 노래가 나와 전시는 역동적이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전시품인 조선 전통 의자를 비롯해 유길준이 지녔던 문방사우, 의복, 악기, 부채 등 일상용품과 더불어, 백남준 비디오아트와 같은 오늘날 한국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었다. 아마도 ‘당시의 한국과 오늘의 한국’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을 연출한 듯해 흥미로웠다. 특히 유길준이 착용했던 개항기 서양식 복장과 부채, 모자 등은 한 인물이 시대를 넘나들며 경험한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유물이 눈길을 끌었지만 <평안도감사도과급제자환영도>에 참석자들이 많이 모였다. 조선 후기에 평양감사가 과거에 급제한 장면을 환영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국정 행사 장면을 담은 대형 병풍이다. 그림의 세부 묘사는 당시 사회의 위계와 예술적 정밀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큐레이터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작품은 한국의 리움미술관이 보존 처리를 하였고 오늘 이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했다.

<평안도감사도과급제자환영도>를 보는 관람객들
유길준 이름으로 기억될, 미국 속 한국
AI 시대에 박물관은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박물관이 갖는 영향력은 크다. 박물관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또는 특정 주제를 핵심적이고 축약적으로 종합하여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때로는 후각까지 동원되는 오늘날의 전시를 통해 마치 스펀지처럼 정보를 흡수한다. PEM 한국관 ‘유길준갤러리’라는 이름에서부터 세계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은 한국과 만난다. 유길준의 이름을 딴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19세기 최초의 미국 사절단과 대화하고, 140여 년 전에 시작된 교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떠올리며, 앞으로 더 풍성해질 이야기를 상상할 것이다.